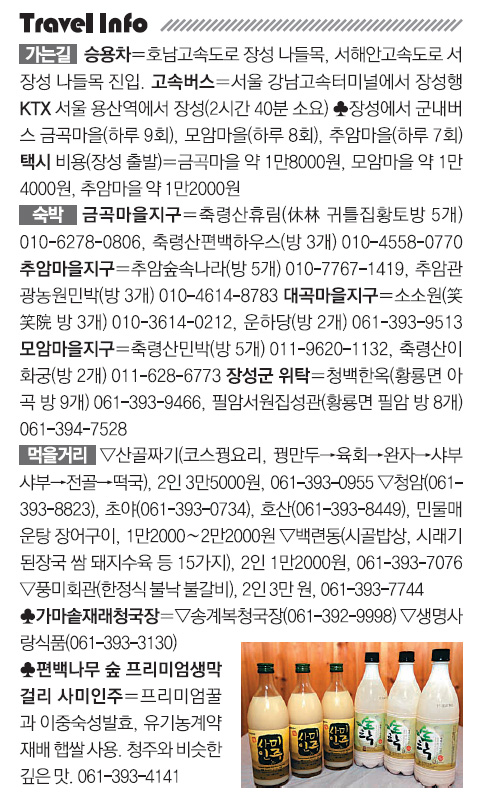Notice
Recent Posts
Recent Comments
Link
문상현의 카미노 (링반데룽)
장흥 편백나무 숲길 본문
해마다 어김없이 늘어가는 나이
너무 쉬운 더하기는 그만두고
나무처럼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
늘 푸른 나무 사이를 걷다가
문득 가지 하나가 어깨를 건드릴 때
|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. 그러나 나뭇가지가 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꽃이 핀 것을 안다. 윤동주 시인은 '나무가 춤을 추면/바람이 불고,/나무가 잠잠하면/바람도 자오'라고 노래했다. 나무가 여린 바람을 부르고, 나무 품에서 바람이 새근새근 잠든다. 그렇다. 나무는 이 세상 모든 생명을 품는다. 별빛과 달빛을 버무려 향기를 내뿜고, 함박눈과 빗물을 녹여 생명수를 콸콸 솟게 한다. 메마른 대지에 꽃을 피우고, 목마른 생명들에게 단물을 준다. 그렇다. 태초에 나무가 있었다. 그렇게 나무는 천 년을 하루같이 산다. 눈 내린 장성 편백나무 숲. 장성=박영철 기자 skyblue@donga.com |
사랑한다!는 그의 목소리가 심장에 꽂힐 때
오래된 사원 뒤뜰에서
웃어요! 하며 나무를 배경으로
순간을 새기고 있을 때
나무는 나이를 내색하지 않고도 어른이며
아직 어려도 그대로 푸르른 희망
나이에 관한 한 나무에게 배우기로 했다
그냥 속에다 새기기로 했다
무엇보다 내년에 더욱 울창해지기로 했다
-문정희 '나무학교' 전문》
장성 편백나무 숲에 눈이 내렸다. 밤새 포슬포슬 복스럽게 내렸다.
겨울 편백나무 숲은 고요하다. 공기는 서늘하고 달다.
피톤치드는 사람에게 무척 이롭다. 숲 속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피톤치드 덕분이다.
피톤치드는 잎이 넓적한 활엽수보다 바늘잎 침엽수에 훨씬 많다. 침엽수 중에서도 편백나무가 단연 으뜸이다.
|
축령산 일대는 온통 편백나무 삼나무로 빽빽하다. 키 20∼30m에 쭉쭉 빵빵하게 잘도 자랐다.
눈 내린 편백나무 숲을 걷는다. 키가 자꾸 낮아진다. 마음이 잔잔해진다. 내 몸속의 역겨운 쇠냄새가 가셔진다.
'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.
― 신영복 '나무야 나무야'에서
김화성 전문기자 mars@donga.com
|
"나무 심는 게 나라 사랑" 생전 20년 동안 253만 그루 심어
■ '숲의 아버지' 임종국 선생
|
그는 원래 평범한 농사꾼이었다. 1956년 우연히 장성군 덕진리 야산에서 쭉쭉 자라고 있는 편백나무 숲을 보게 됐다.
그는 그해 봄 삼나무 묘목 5000주 시험 재배에 성공했다.
1968년, 1969년 2년에 걸쳐 큰 가뭄이 들었다. 나무들이 타죽어 갔다.
임 선생은 점점 더 넓은 땅에 나무를 심었다. 하지만 그는 가진 게 없었다.
|
| 임종국 선생이 잠든 편백나무숲 느티나무. |
2002년 산림청은 개인 소유의 편백나무 숲 240ha를 사들였다.
임 선생은 마지막 유언도 나무 얘기였다. "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.
'그는 그 황무지가 누구의 것인지 관심조차 없었다. 그저 자신이 할 일을 고집스럽게 해나갈 뿐이었다.
― 장 지오노 '나무를 심은 사람'에서
방황하고 지친 영혼에 쉼터 제공
■'세심원 지킴이' 변동해 씨
|
숙박료나 먹을 것 모두 무료. 독에는 쌀이 가득하고(한 해 1t 소비), 김치 된장 고추장 등 밑반찬도 넉넉했다.
이제 세심원은 일반인은 받지 않는다. 열쇠도 모두 회수했다.
변 씨는 평범한 농고 출신이다. 그는 30년 동안 장성군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2005년 봄에 스스로 그만뒀다.
"요즘 자기 손으로 집 지을 줄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.
그는 8년째 숲 속에 차씨를 뿌리고 다닌다.
경이로운 야생의 생생한 현장
'부엔 까미노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바다가 보이는 숲 키 큰 그 나무 그 제주도 (0) | 2011.12.23 |
|---|---|
| 아주 다른 세상의 길 (0) | 2011.12.15 |
| 지금 절정이던 남산의 고운 단풍길에 (0) | 2011.11.21 |
| 어디에 서 있어도 슬픈 나무 자작 (0) | 2011.11.21 |
| 제주 올레 전코스 보기 (0) | 2011.11.15 |